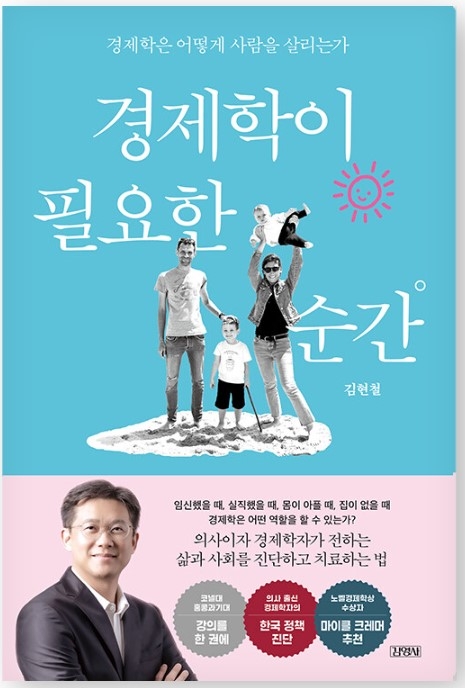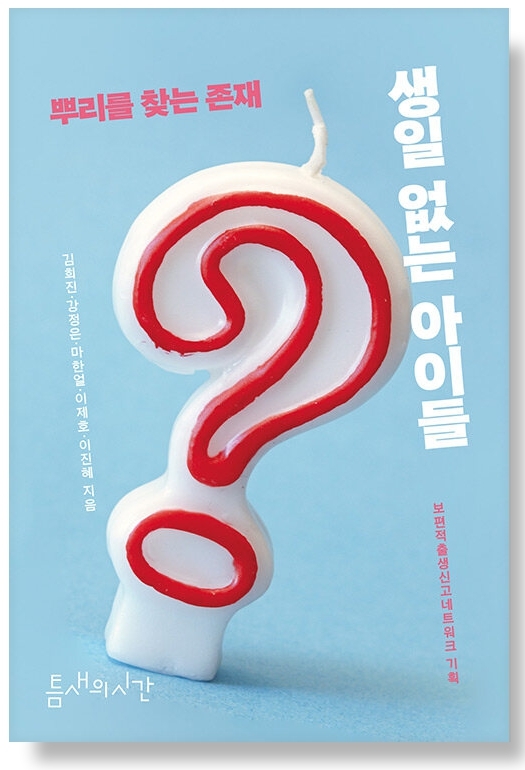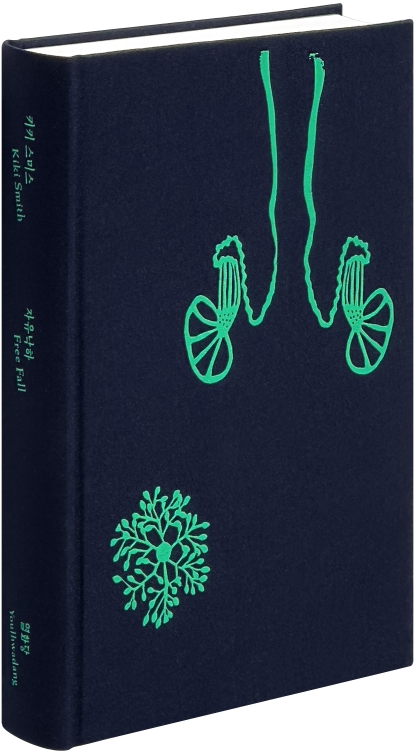[지난책 되새기기] 대한민국 원주민
입력 : 2016-11-04 17:08: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대한민국 원주민은 무척 담담하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있다. ‘가난에 익숙하지만 궁상 맞지는 않은 작가’라고. 작가는 단 두 쪽에 20컷 내외의 그림과 압축적인 대사로 우리 삶의 어떤 장면을 꽉 채워버린다. 장남과 막내의 차이, 조기 출근, 죽는 짐승, 장녀, 로맨스, 밤손님 등등.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제법 정원 꼴을 갖췄던 마당은/ 몇 년을 못가서 남새밭이 돼버렸다/ 미끈한 화강석 깔아 만든 베란다는 고추 말리는 데 쓰고/ 시멘트 기둥에는 직접 거둔 콩으로 쑨 메주들이 달렸다./ 동네 노인들은 뒷산 아래 국유지를 손바닥만큼도 놀리는 법이 없다./ 손수 기른 작물들을 만질 때는 제일 밝은 웃음을 웃는다. “이거 함 봐라. 올매나 에뿌노? 보고 있으모 안 무도 배가 안부르나?”/ “또 밭에 갑니거?”/ “너도 함 가보자. 배차가 올매나 잘 됐는데...그리 좋은 구경을 안할라 카나..”/ 알림 당지역은 고등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되었으니 일체의 경작 행위를 금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분해서 우짜꼬...”’
이것이 이 책 안의 단편 ‘원주민’의 내용이다. 딱 우리네 이야기다.

사람이 모양이 같다고 생각이 같지 않듯이, 여기 그려진 사람들이야말로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먼 옛날 인간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세월이 급히 흐르면서, 세대별로 인간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몇 년 후 그는 [송곳]을 펴냈다. 장편이어서 그런지 완전히 결이 다르다. 깊어진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욕을 먹고, 살인자가 피해자 몸을 가르려 하고, 권력의 이름으로 재벌을 털어 아방궁을 짓는 엉망진창 세상사와 달리, 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서민의 삶-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녹아있는 이 책으로 잠시 편하게 쉬어보자.
글 홍예정 자유기고가
#51 창간2주년 특집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