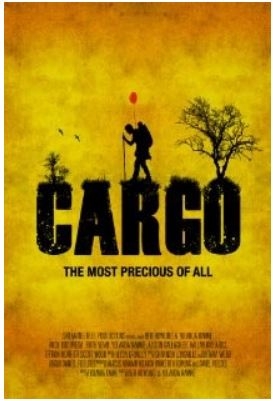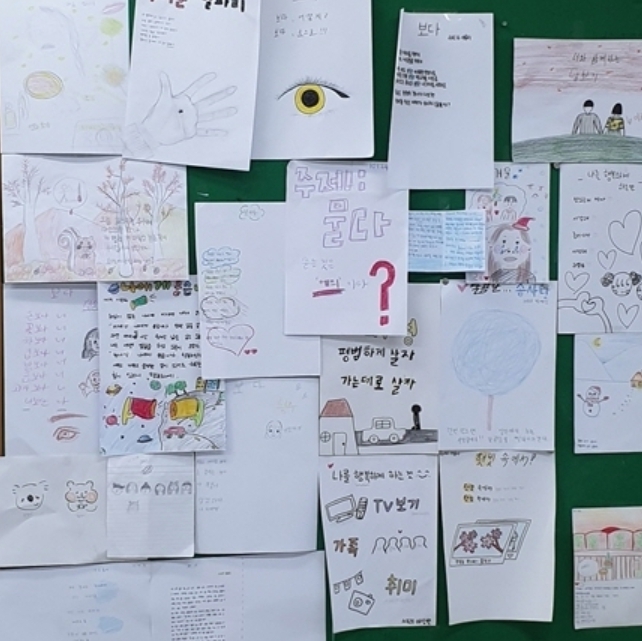흔한 고딩의 같잖은 문화 리뷰 <12> 우리는 ‘사랑’과 ‘우정’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을까
수정 : 0000-00-00 00:00:00
우리는 ‘사랑’과 ‘우정’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을까
“편한 건 우정이고 설레는 건 사랑이지.” “그래? 그럼 넌 편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설레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 편한 사람.” “우정이라며.” “음…. 모르겠다.”




▲다큐영화 ‘그건 사랑이었네’의 장면들
우리는 사랑과 우정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대화는 다큐멘터리인 ‘그건 사랑이었네’ 속의 인터뷰 장면이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청소년 경쟁 부문 출품작인 이 작품은 사랑과 우정 사이의 경계를 의심하고 고민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부드럽게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한다.
영상 속의 학생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마무리 했지만 나는 그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만둘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동성애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감정들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양한 사랑을 봐왔다. 실제로 사랑을 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사랑은 꽤나 다양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과 같은 순수한 사랑을 제외하고 본다 해도, 부자와 서민의 사랑, 상사와 부하 직원의 사랑 등 매번 색다른 소재의 사랑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의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에 관련한 것은 한 번도 자연스럽게 접해본 적이 없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배우의 커밍아웃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유령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은 당연하게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억압당하게 만든다. 이성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정과 같은 종류의 감정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여겨져야 할 지향성이 남들과 다르고, 내가 봐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성소수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랑을 접해야 한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다 지금껏 그 존재를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렇고, 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두는 건 특히 위험하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해야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무척이나 외롭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많은 소수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조은현 고1 「파주에서」 틴 청소년기자

☆시놉시스
우정과 사랑이라는 감정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려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복도를 다니기도 한다. 속상한 일이 있는 친구를 안아주는 등 스킨십도 꺼리지 않는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때론 친구 이상으로서의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감독의 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산다. 그런 사회에서 조금 특별한 사랑을 하는 이들은 과연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솔직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을 깊이 좋아하는 것이다. 때론 친구 사이에서의 강한 질투심과 그리움을 포함한 그 미묘한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많고 많은 나와 다른 것들 중 하나인 성 정체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리뷰
우정과 사랑 사이에 경계가 있을까? <그건 사랑이었네>는 이 흔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심지어 제목이 ‘그건 사랑이었네’이다.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독은 이 뻔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영화를 통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연결해낸다. 그 과정에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 꽤 탄탄하게 힘을 실어준 건 인터뷰이다. 우정과 사랑을 주제로 한 감독의 질문에 또래 친구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았던 건 인터뷰에 응하는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밝고, 진지하고, 설레어하고, 신난 모습들. 무엇보다 어디선가 들었던, 그래야 할 거 같은 정해진 답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가 경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그녀가 라는 전제가 깔린다. 이런 질문과 답변들이 주는 생기 가득한 왁자지껄함만으로도 다시 보고 싶은, 꽤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우정과 사랑의 경계의 기준이 성별일 필요는 없다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사람을 두고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에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랑을 둘러싼 어쩌면 민감할 수도 있는 이슈를 다루면서 나와 내 주변, 구체적인 사람과 상황, 경험을 연결해서 질문하고 답을 탐색해 가는 태도는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49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